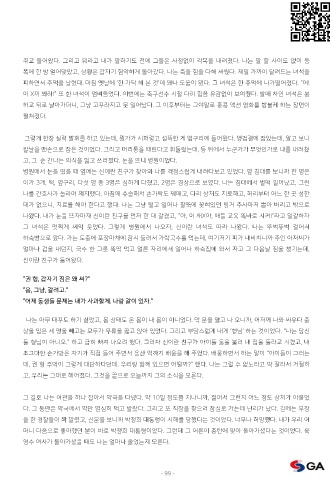Page 99 - V5_Book_EsseyBiz
P. 99
쥐고 들어왔다. 그리고 뭐라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은 사정없이 각목을 내려쳤다. 나는 말 할 사이도 없이 등
쪽에 한 방 얻어맞았고, 상황은 갑자기 험악하게 돌아갔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제일 가까이 달려드는 녀석을
피하면서 주먹을 날렸다. 마침 옛날에 ‘한 가닥 해 본 것’이 꽤나 도움이 됐다. 그 녀석은 한 주먹에 나가떨어졌다. “어!
이 X끼 봐라!” 또 한 녀석이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축구선수 시절 다리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발에 차인 녀석은 붕
하고 뒤로 날아가더니, 그냥 고꾸라지고 못 일어났다. 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홍콩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렇게 한창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시퍼렇고 섬뜩한 게 옆구리에 들어왔다. 엉겁결에 잡았는데, 알고 보니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머리통을 때린다고 휘둘렀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로 나를 내려쳤
고, 그 순 간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신이란 친구가 찾아와 나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 침대를 보니까 한 명은
이가 3개, 턱, 옆구리, 다섯 명 중 3명은 심하게 다쳤고, 2명은 경상으로 보였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런
나를 간호사가 놀라며 제지했다. 아침에 수술해서 손가락도 꿰매고, 다리 상처도 치료하고, 허리부터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냥 털고 일어나 팔뚝에 꽂혀있던 링거 주사마저 뽑아 버리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신이란 친구를 먼저 한 대 갈겼고, “야, 이 새X야,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일갈하자
그 녀석은 멋쩍게 씨익 웃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자, 신이란 녀석도 따라 나왔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서
하숙방으로 왔다. 가는 도중에 포장마차에 잠시 들려서 가락국수를 먹는데, 여기저기 피가 내비치니까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겁을 내던지, 국수 한 그릇 뚝딱 먹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하숙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짐을 챙기는데,
신이란 친구가 들어왔다.
“권 형, 갑자기 짐은 왜 싸?”
“응, 그냥, 갈려고.”
“어제 동생들 문제는 내가 사과할게. 나랑 같이 있자.”
나는 아무 대꾸도 하기 싫었고, 몸 상태도 온 몸이 내 몸이 아니었다. 막 문을 열고 나 오니까, 어저께 나와 싸우다 중
상을 입은 세 명을 빼고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내게 ‘형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
들 형님이 아니오.” 하고 급히 빠져 나오려 했다. 그러자 신이란 친구가 아이들 둘을 불러 내 짐을 들라고 시켰고, 내
조그마한 손가방은 자기가 직접 들어 주면서 용산 역까지 배웅을 해 주었다. 배웅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이 그러는
데, 권 형 주먹이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우리랑 함께 있으면 어떨까?” 했다. 나는 그럴 수 없노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
고, 우리는 그대로 헤어졌다. 그것을 끝으로 오늘까지 그의 소식을 모른다.
그 길로 나는 여관을 하나 잡아서 약국을 다녔다. 약 10일 정도쯤 지나니까, 젊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
다. 그 동안은 약국에서 약만 열심히 먹고 발랐다. 그리고 또 직장을 찾으러 잠실로 가는데 난리가 났다. 길에는 무장
을 한 경찰들이 쫙 깔렸고, 신문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허망했다. 내가 우리 어
머니 다음으로 좋아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육
영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 99 -